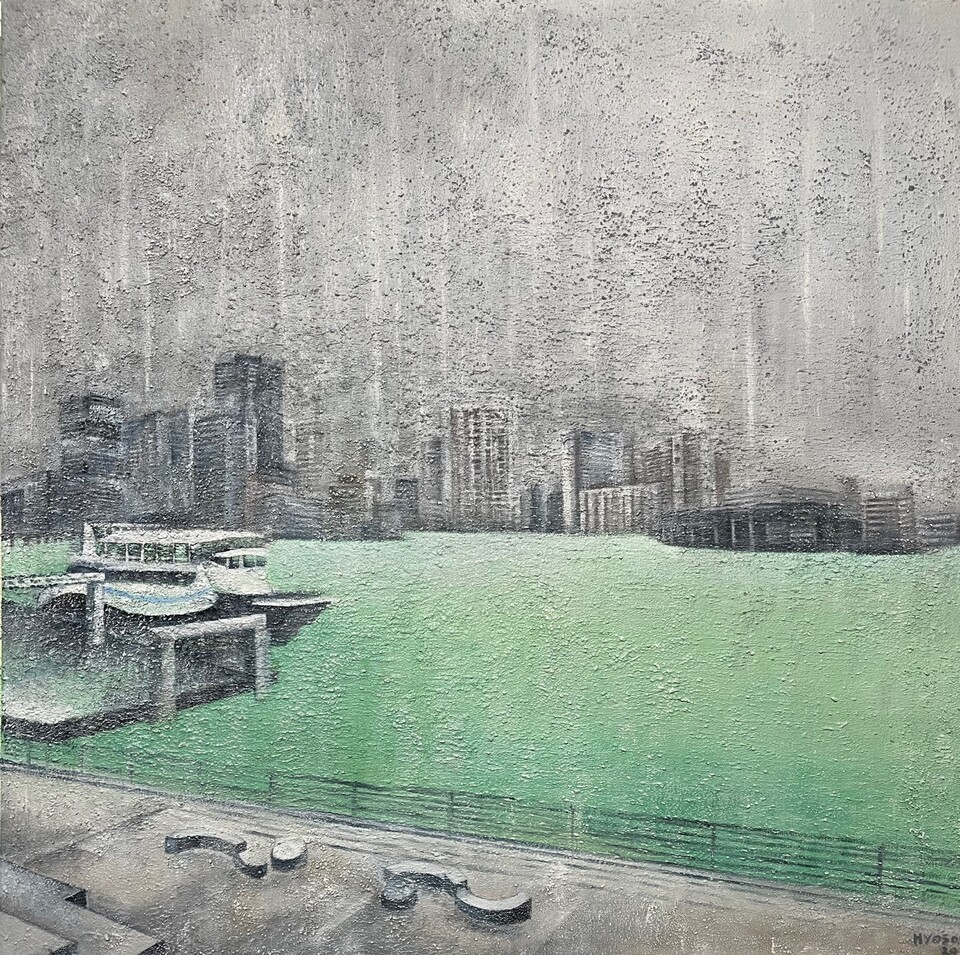
귀향 4. Hey, YOU…(그렇게도 날 부르던 너…)
그렇게도 날 부르던 너…
비오면 비오는대로
바람불면 바람부는대로
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날 맞아주고 있었다.
단발머리 소녀는 겨울이 되어
교복위에 입은 코트 단추를 단디여밀고
목도리도 돌돌감고 버스를 탄다.
기차역에 내렸다.
“부산요”.
말이 짧았다 .
그땐 그랬다.
짧은 말이 조금 수다스러워질때는 예외가 있었다.
한 소년이 저만치 친구와 함께 사생대회 갔다 버스에 오를쯤 그때는…
가끔씩 보는 보증수표처럼 생긴 그 소년의 시선을 받고 싶은 날이면…
그 소년의 친구는 한때 수채화 그림으로 금호강을 정화해 버렸었다.
비둘기호 기차에 탔다.
운좋은 날은 창가에 어깨를 기대고
생각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.
다리놓을 자리가 정해져있었기에…
차장 언니의 “오라이” 소리에 버스는 움직였고 그 날도 어김없이 태종대에 도착했다.
막막한 시선이 망망대해를 옮겨다녔다.
아마 나의 시선이 Seattle Puget Sound를 향했을 수도…
바다는 통했으니까…
중학교를 졸업하고..
이번엔 내가 필요해 다가갔다…
“부산요” .
여전히 짧았다.
외숙모님 구내식당에 도착했다.
열살아래 두 외사촌들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외숙모님의 뒤를 따라 국제시장, 광복시장, 서면시장, 자갈치 시장.. 을 누볐다.
봉다리 봉다리에 가득 담아온
찬거거리를 다듬고..설걷이를 하고…
그렇게를 한달…
난 고등학교 교복비를 벌었다.
집으로 향하는 날!
기차역에서 말이 쫌 길어졌다.
“영천갑니다”.
고등학교를 교복입고 갈 수 있었기에…
중2때 다가온 아부지의 파산..
가난!
불편했다.
세상을 보게했다.
삐딱선을 타고 내 스스로의 상념에 질퍽하게 젖었어도 “쩐” 외에 귀한 것들을
보았다.
세월을 휙 넘어 소녀의 나이가 50을 넘긴 어느 날..
태종대 유람선에서 편안히 바다를 보고있을때 누군가가 어깨를 톡톡쳤다.
“처자 고마 바다에 뛰어들지 마이소“.
긴머리에 혼자서 바다를 바라보는 내 뒷모습이 바다에 뛰어내릴 듯 슬픈 여인으로 보였나보다..
난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
“어디에 절대로 못뛰내립니더 내 아들을 우야라꼬요“.
“하머“! 하고 맞장구치는 넉넉한 아지매 부대들의 얼굴도 피어졌다.
그제서야 유람선에서 흘러나오는 ”
돌아와요 부산항“이 들리기 시작했다..
더 세월이 흐르고 …
또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.
넉넉하게 도착했다.
완행 열차도 아니고
내차를 타고 …
자갈치 시장안에서 국수에 조개탕 시켜
”마이 묵어“ 하는 친구도 내 앞에 있었다.
흔들리는 세월을 흘러서 넘어
내 눈 앞에 흐르는 저 바다를
비가 흐르는 창문을 통해 보고있었다.
바람막이 안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.
다시 네가 날 불러도
이제는 이렇게 올께…
흰머리 드문 드문..
적당히 나잇살을 가진 내가 넉넉하게 다가올게…
